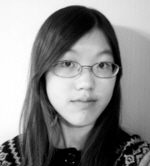
내가 가진 수많은 위로
최근 어떤 일 속에서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상한 한계를 만났다. 그 앞에 서서 나는 내 속을 헤집으며 나에 대해 몇 번이고 다시 생각해본다. 어떤 노래 가사 중에 ‘내가 가진 수많은 이야기’라는 구절이 떠올랐다. 글 쓰는 것을 동경하는 사람으로서 소설의 소재나 구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과 별개로 자기 자신의 내면에 많은 이야기가 흘러넘치고 있어야 할 텐데, 지금의 나는 너무나 지쳐 있고 내 안의 많은 것은 고갈돼 버렸고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무 살 주제에 이런 생각을 할 자격이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볼 때마다 한때 그곳을 가득 채우던 이야기들이 다 어디로 가버린 것인지 텅 빈 공백 밖에 보이지 않아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스무 살이기에 더 당황스러웠다. 내 이야기이지만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가 아니지만 내 이야기인 그런 이야기들을 쓰고 있지만 정작 나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하나라도 가지고 있기는 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잃어버린 이야기들을 찾는 것, 아니, 전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드는 것을 소망해 본다. 좀 더 많은 것을 보고 좀 더 많은 것을 좋아하고 좀 더 많은 것을 의무보다 즐거움으로,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받아들여보고 싶다.
어떤 아이가 물었다. 넌 책을 왜 읽어? 나는 멈칫했다. 그 아이가 내게 뭔가를 물을 때마다 나는 왠지 대답을 망설이는 때가 많다. 그리고 결국 모르겠다고 하는 때도. 별것 아닌 질문에도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아이에게는 뭔가 본질적인 대답을 해주고 싶어서이다. 나는 대답했다. 봐야하는 책만 보다가보면 문득 그런, 감상이 담긴 글을 읽고 싶어질 때가 있어. 그러니까, 왜? 왜 읽고 싶어지냐고? 그냥 갈증 같은 거야. 그런 걸 해소하려고. 어디선가 읽은 ‘활자가 그립다’는 표현, 그런 느낌을 말하고 싶었다. 그 아이는 말했다. 나는, 위로를 받으려고 읽어. 다른 무엇도, 내게 책이 주는 것 같은 위로를 주지 못하니까.
그렇다면 언젠가 아주 나중에라도 내가 쓰는 글에서 누군가가 위로를 찾을 수 있어야 할 텐데 지금까지의 나의 보잘 것 없는 글들은 읽는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쓰고 있는 나를 위한 글들이었다. 나는 그 아이와 달리 읽는 행위에서조차 별다른 위안을 얻지 못했고, 그래서 이기적인 글들을 쓰면서 나를 위로했던 것 같다. 언젠가는 읽는 사람과 쓰는 사람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글을 쓸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