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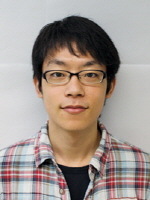
이후 신문사에서 대학원생의 문제를 다루고 싶다는 생각을 한 뒤에도 이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익명일 수밖에 없는 대학원생들의 절절한 이야기를 아무리 실감나게 전한다 해도 예전의 나처럼 일부의 문제일 뿐이라고 여기면 그만일 것 같았기 때문이다. 대학원생들이 적지 않은 용기를 내 꺼낸 이야기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과장된 푸념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생각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문제를 느끼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자발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는 대학원생 모임의 도움을 받아 설문을 준비했다. 일요일 새벽에 이메일로 발송한 설문조사에는 하루가 채 지나기 전에 2백명 이상이 응답을 보내왔다. 열흘간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예상을 뛰어넘어 1천2백명에 가까운 대학원생이 참여했다. 대학원생들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곳이 필요했던 것이다.
“대학원에 진학한 것을 인생 최대의 실수로 생각한다.” 설문조사의 마지막 ‘자유기술’에는 그동안 털어놓지 못했던 대학원생들의 이야기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이런 설문조사를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한 대학원생도 있었다. 자유기술에 응답한 3백여명의 대학원생들이 보낸 한탄과 호소, 문제의식과 해결책을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대학원을 열악한 공간, 부당한 일만 가득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설문결과에 대해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분명 다를 것이다. “예전에는 이보다 더했다”거나 “본인이 선택한 길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것도 모두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도 한번쯤 대학원생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학문적 성취는 기본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고통을 감내했을 때만 얻어지는 것인지, 교수의 귄위는 절대적인 권한을 통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모여 이야기가 시작되고, 작은 변화로 이어진다면 멀고 거대하게만 느껴지는 대학원생의 문제도 개선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학교와 연구 이전에 사람이 있다는 생각. 짧지 않은 설문조사에 임한 대학원생들의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길 기대한다.
이정원 취재부 차장
poibos85@snu.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