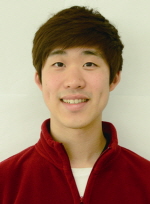
취재부
만약 이러한 기사나 글을 대중 매체에서 접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학생들의 행동에 분노할 것인가, 후보들을 동정할 것인가? 아니면 학생들이 그랬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한없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할 것인가?
사실 위 이야기는 지난 목요일 본부 앞 셔틀정류장에서 열렸던 공동선본발족식을 재구성한 것이다. 우리학교 학생임이 분명했지만 발족식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다가간 예닐곱 명 모두 “듣지 않아서 모르겠다”라고 답하는 한결같은 모습과 학생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나온 선본의 자기소개를 마치 라디오에서 나오는 제품 광고 정도로 생각한 듯 너무도 당당히 듣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들을 보며 나는 문득 직전 총학에 대한 스누라이프 내 비판여론이 떠올랐다. 스누라이프의 수많은 글은 총학의 무능함을 꾸짖고 학생회장을 비판하기 바빴다. 물론 총학생회장으로 뽑힌 이상 이러한 비판은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48.738%의 투표율로 무산된 1차 선거와 연장 투표까지 진행된 재선거에서 50.37%의 투표율로 겨우 성사된 제54대 총학에게 과연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냉철히 비판하는 것이 합당한가란 의문이 들었다. 우리는 그들을 비판하고 실망할 만큼 충분히 지지하거나 관심을 가졌던가? 혹은 그들의 정책이 올바르게 진행되는지 임기 내 한번이라도 감시해본 적 있는가? 눈앞에서 이야기하는 순간도 들어주지 않으면서 나에게 헌신하는 총학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이율배반적이지 않은가.
지난주 최초로 직선제로 진행된 교수협의회 선거에서 62.1%의 투표율로 신임 교수협의회 회장이 선출됐다. 이를 통해 교수협의회는 본부에 더 많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당위성을 확보했다. 총학 역시 마찬가지다. 학생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기구로서의 당위성 확보는 다가올 재선거의 투표율이 보장해줄 수 있을 것이다. 총학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자. 비판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