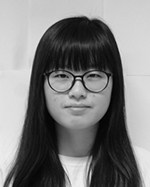
발빠른 외교로 삼국통일 이룬 신라
주변국 견제하며 주체성 견지한 발해
역사에서처럼 외교적 목표 분명히 해
올겨울 매서운 외교적 위기 타개해야
이번 겨울 중국의 시안과 일본의 나라·교토 지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1300년 전 당의 수도였던 시안은 동서 교류의 중심지였다. 시안 박물관의 화려한 당삼채(녹·황·백색을 띠는 당나라 때의 도기)와 시내를 가로지르는 격자형의 대로(大路)에서 당시 시안의 번영을 그릴 수 있었다. 같은 시기 일본에서는 나라와 교토가 각각 나라·헤이안 시대의 수도로 발전하고 있었다. 중앙집권적 국가로 성장한 일본은 당과 우리나라로부터 신문물을 도입했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두 절, 도다이지(東大寺)와 기요미즈지(淸水寺)는 일본에 핀 불교문화의 꽃을 아직 간직하고 있었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번영을 누렸던 지역을 돌아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한국은 이 틈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대륙에는 당이라는 대국이, 남방에는 신흥국가 일본이 자리했던 시기, 한반도에는 신라와 발해가 있었다. 삼국시대를 통일한 신라는 당과 일본 사이에서도 하나의 주체로 우뚝 섰다. 신라의 삼국통일을 두고 영토를 대동강 이남으로 국한했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한반도의 소국 신라가 통일을 이룩한 것은 놀랄만한 일이었다. 이는 신라가 고구려, 백제, 당, 왜가 얽힌 복잡한 동아시아의 정세에서 발빠른 외교정책을 택한 덕이었다.
발해의 상황도 녹록치는 않았다. 신라, 당은 물론이고 흑수말갈, 돌궐, 거란 등의 틈바구니에서 발해는 급변하는 외교관계에 역동적으로 대응했다. 당에 대한 강경책을 고집하다가도 더 이상 당에 맞서기가 어렵게 되자 대당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일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에 유연책을 취하면서도 결코 주체성을 잃지 않았다. 일례로 일본에 보내는 외교 국서에서 발해는 외교적인 예의상 ‘천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도, ‘발해왕은 말한다’라고 명시해 스스로를 낮추지 않았다.
그로부터 1300년이 흐른 올 겨울 우리나라의 외교는 매섭게 추웠다. 지난해 말 일본과의 위안부 한일협정은 역사문제를 청산하기는커녕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를 다시 들쑤셔놓았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협정은 우리나라가 피해자임에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사드 배치를 두고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항장의 칼’은 본의 아니게 우리나라를 겨누는 꼴이 됐다. 엎친 데 덮친 격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개성공단까지 얼어붙으며 ‘외교 한파’는 더욱 매섭기만 하다.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없게 됐음은 물론, 국내 여론까지 뒤숭숭하다.
주목할 것은 국내의 평가도 엇갈린다는 점이다. 작금의 외교 상황을 두고 정부는 ‘이제껏 없던 성과’라며 자화자찬하는 한편, 일각에선 ‘퍼주기만 하고 돌려받은 것은 없다’ ‘완전히 실패했다’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평가가 극단으로 엇갈리는 것은 외교의 목표가 분명치 않았기 때문이다. 얻고자 하는 바가 내부적으로도 갈리다보니 누군가는 1%의 이득도 얻지 못했다고 느끼는 반면, 누군가는 100%의 이익을 얻었다고 느끼는 것이다.
결국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외교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 즉 목표의 재설정이다. 1300년 전, 신라와 발해는 국가를 존속시키고 다른 국가를 견제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외교 관계를 맺거나 파기하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체적이고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300년 전 그 자세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분명하다면 우리나라에 무기를 배치하는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하지 않고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책망해야 하는 문제에 있어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살얼음판 같은 동아시아의 정세에서 한국의 입지는 협소하기만 하다. 혹자는 ‘전쟁 직전의 위기’라 말하지만 사실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위치한 우리나라에게 이러한 상황은 그다지 낯선 것만은 아니었다.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과거의 우리를 돌아볼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