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브라더와 판옵티콘의 시대가 본격 도래하는 것일까. 국회의장께서 뜬금없이 국가비상사태를 외치시니, 진짜로 나라 돌아가는 사태가 참 비상이구나 싶은 요즘이다. 모호하고 초법적인 저 법의 불안한 칼날은 거리와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이들에게 날아들기 십상이라서, 아, 악법은 가깝고, 쉿, 말은 무서워라. 이제 우리는 기본권과 시민권, 국가주의와 전체주의, 감시메커니즘과 생명정치에 관한 글들을 다시 꺼내 읽어야만 할 것이다. (판사님, 이 글은 저희 집 토끼가 쓰고 있습니다.)
뭐라 입을 열기도 무서운 시절이 돼버렸으니, 저 무소불위의 법에 대해 말하는 대신 차라리 지난 192시간 27분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할까. 저 8일 남짓의 시간은 그야말로 ‘끊이지 않는 말들의 시간’이었다. 기실 우리가 얼마나 말다운 말이 없는 정치를 봐왔던가. 내용 없는 구호들, 따분한 반복과 미사여구들, 너무 뻔해서 당혹스러운 거짓말, 심지어는 폭력부터 책상을 두드리는 유아적 소음까지…. 정치가 소통불능, 그야말로 바벨의 혼돈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마이국회텔레비전’은 드물게 건강한 담화의 순간이었을 것이다. ‘죄 읽어주는 남자’ ‘굿모닝 법스’ ‘법이 빛나는 밤에’ ‘근현대사 강좌’와 같은 유쾌한 명명과 SNS의 온갖 반응들은, 저 시간 동안 들을 만하고 논의할 만한 말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왔는지를 짐작케 한다.
그러나 말이란 것이 모두에게 똑같이 소통되는 것은 아니어서, 어떤 이들에게는 저 토론 역시 다만 선거를 위한 선전도구로 이해됐었나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들과, 연단에 선 의원들의 각기 다른 마음가짐, 축제와도 같았던 소통의 열의가 모두 무색하게 말이다. “우리가 긴 시간 목격했고 함께 한 것이 선거용 퍼포먼스가 아니었다”고 결연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무제한 토론의 이러한 중단 앞에서 아마 다음과 같이 묻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우리는 왜 토론을 중지해야 했을까, 정말 저 말들은 단지 이기고 지는 문제에 관한 것이었을까, 민주주의의 목표란 오직 선거의 승리뿐이란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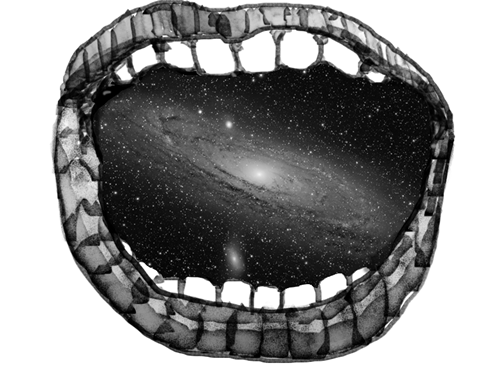
나는 지금 68혁명의 반전(反戰) 가두시위가 한창일 당시 어느 정치인의 말을 떠올리고 있다. 그는 반(反) 폭동법을 제안하면서 아주 ‘세련되게’ 민주주의를 끌어들인다. “민주주의에서 우리는 시끄러운 소수가 침묵하는 다수에게 자신들의 법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저 정치인은 시위와 대조되는 ‘온건한’ 방식, 곧 선거를 통해서만 국민이 입 열기를 주장하고 있었으니, 거칠게 다시 옮기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입 다물고, 투표하고, 정해진 자들이 하는 일에는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라.” 대체 이런 것이 민주주의인가? 우리는 삶의 복잡다단한 사안들을 그렇게나 단순하게 해결해야 할까?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어버린 저 알렉산더의 칼만 바라보면서? 전차가 어디로 달려갈지라도 저 마부만을 무조건 믿으면서?
부당한 것이 남아있는 한, 말은 계속돼야 한다. 우리는 그저 침묵하는 다수로 남아서는 안 된다. 주지하듯 민주주의라는 말은 특정 정체(政體)라기보다 “모두가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싣는 텅 빈 기표”라고 이해될 수 있는데, 바로 이때 우리는 결정되지 않은 민주주의의 기의를 위해 수다한 논의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뽑힌 누군가가 아닌 모두가 권력의 주인인,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부단히 소리 내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러므로 멈추지 않는 어떤 상태에 관한 것. 지금 여기, 필리버스터는 끝났다. 곧 찾아올 총선 역시 승자와 패자를 떠들썩하게 가리고 끝날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순간에도 민주주의는 계속돼야 한다. 토론은 여전히 계속돼야만 한다.
백수향 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