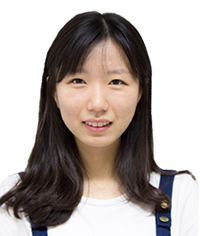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열풍이 뜨겁다. ‘국민 프로듀서’라는 지위를 부여받은 시청자들이 직접 아이돌 그룹을 만든다는 Mnet의 <프로듀스 101>이 대표적이다. 심사받은 등급에 따라 다른 색의 옷을 입고, 투표로 정해진 순위를 가슴팍에 붙인 채 노래하는 연습생들의 간절함에 시청자들은 공감했고, 프로그램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학교라는 컨셉으로 춤, 노래 등을 가르치는 와중에 투표 결과에 따라 ‘퇴학’과 데뷔의 갈림길에 놓이는 <아이돌학교>, 유명 기획사 사장이 전국 기획사를 돌며 가능성이 보이는 연습생들을 데려다 경쟁시키고 최종적으로 9명의 그룹을 만든다는 <믹스나인> 등이 횡행하는 지금, ‘이러다 전국민이 아이돌이 되겠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유행은 문화를 반영한다. 몇 년 전 육아방송이 급증한 것은 육아와 출산 전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요리방송의 꾸준한 인기의 비결은 팍팍한 삶 속에서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욕구를 포착한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오디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계층과 동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하지 못하는 현실의 불공평함에 불만을 토로하며 정해진 규칙 아래서 철저하게 실력, 매력으로 승부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쾌감을 느낀다. 때문에 오디션 프로그램은 타 프로그램보다 공정성 논란이 더욱 거세게 받는다. 이미 데뷔한 경력이 있는 연습생의 <프로듀스 101> 출연 자격에 대한 갑론을박은 프로그램 내내 지속됐다.
그러나 오디션 프로그램의 애청자가 된 사람들의 기저에는 ‘경쟁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에 내몰리는 현대사회에서 경쟁을 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은 자연스럽다는,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도태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다. 때문에 오디션 프로그램은 사회에 스며들 수 있었다. 그 와중에 경쟁의 폭력적 속성은 기억에서 쉽게 지워진다. 경쟁의 필연적인 산물인 순위(숫자)에 의해 경쟁의 참가자에겐 해당 숫자의 대소관계가 부여된다. 이는 참가자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가능하게 하는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된다.
프랑스의 비평가 르네 지라르는 인간의 욕망은 자율적인 선택이 아닌 이상형이나 경쟁자를 매개로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어려서부터 수많은 경쟁에 노출된 탓일까, 나는 언제부턴가 ‘잘한다’는 단어에는 ‘무엇보다’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생각했다. ‘타인보다 잘한 것’이 비로소 ‘잘한다’는 객관적 근거라고 여겨 절대평가보다 상대평가를 선호했으며, 어쩌다 듣는 칭찬엔 명확한 비교 대상을 요구했다. ‘타인보다 잘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경쟁이 일상화되며 지라르의 주장처럼 경쟁이라는 구조가 욕망의 매개체로 작동한 것이다. 하지만 경쟁의 특성상 승자는 소수에 불과하며, 다수는 욕망의 실현 실패로 인한 좌절감, 나아가 무기력함을 학습하게 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분별한 경쟁과 이를 조장하는 일부 오디션 프로그램을 경계하게 된다. 시청자들은 누구보다 절실하게 경쟁에 임하는 참가자에게 호감을 보이지만, 경쟁을 의식하지 않고 의연함을 보이는 참가자에게는 진정으로 매료된다. 경쟁 그 자체가 비생산적인 욕망을 끊임없이 생성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자.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사회에서, 경쟁에 먹히지 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