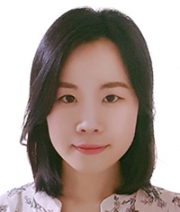
짐 자무쉬의 영화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이 살아남는다』에는 아름다운 뱀파이어들이 등장한다. 유사 이래 예술가로 살아온 이들은 좀비로 인한 우울증과 오염된 인간의 피 때문에 멸종의 위기에 처한다. 자살을 결행하기 직전, 뱀파이어들은 한 연인을 보게 되고 다시 한번 사랑하는 주체로 살아가고자 한다. 아포칼립스 장르의 유행 속에서, 종말과 사랑이 나란히 놓이는 장면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어차피 끝날 세상이라면, 사랑이 뭐가 대수란 말인가?
얼마 전 한국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생각을 나누던 자리에서, Y가 이런 말을 했다. 누군가를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일이 타자에 대한 우리의 감수성을 키워줄 것이라고, 그러니 우리는 더 많은 사랑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말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안타까워해야 할 것은 세상의 각박함이 아니라, 사랑의 기회가 점점 희소해져 가고 있는 현실일지 모르겠다.
사랑한다는 것은 한 대상에게 무한한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부어, 그 존재를 중심으로 운동하는 세계를 탐독하는 일이다. 사랑의 대상이 취하는 극소의 떨림도 사랑하는 주체의 세계에 격동을 일으킨다. 그만큼 사랑은 우리를 매우 민감하게 만든다. 그런 점에서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행위와 같다. 읽기는 독자의 에너지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감각을 섬세하게 분할하고 재배치한다. 누군가의 가슴에서 일었을 느낌의 포말들이 그 기원을 잃어버린 채, 한때는 신성이 의미를 제자리에 총총히 두어 밝혔을 언어의 동굴을 지나, 기의 없는 기표들의 사물성에 실려 어느 말-운반자의 책상에서 긴 밤을 넘기고 나면, 그것은 비로소 요구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느낌들에,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모든 감각들을 불러 모을 것을. 하지만 텍스트란 본질상 타자에 속한 것이므로 나의 해석체계는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거기에는 언제나 접근 불가능한 차이가 남는다. 그런 점에서 탐정소설이란 지독한 열병에 빠진, 그러나 아직 사랑의 대상과 조우하지 못한 자의 기록이다. 오히려 탐정은 그가 추리에 실패할 때, 바로 그 실패를 통해서만 사랑의 진실에 잠시나마 접근한다. 하여, 읽는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신비와 상처를 동반하는 행위인 셈이다.
조르지오 아감벤은 『불과 글』에서 이야기의 근원은 신비에 있고 모든 문학 장르는 신비를 상실한 언어의 상처들이라 했다. 종말에 관한 작품들을 연구하다 보면 때때로 깊은 회의감과 마주하게 된다. 어둠 속에서 지속되는 삶의 말들이 이미 와버린 희망의 파열이라면?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가상성의 허물이 벗겨졌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세계의 뼈대라면? 아직 채 노랫말을 찾지 못한 흥얼거림이라면? 모든 서사들의 후퇴 뒤에 잔존하고 있는 이야기적인 것의 불씨라면?
무너져 가는 세상에 대한 문화적 탐닉이 사랑을 찾아 헤매는 것도 그러한 연유다. 시대적 폐색감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어떤 존재의 ‘거기 있음’을 아름답다고, 이 땅에 신비가 있었던 유일한 증거라고 느낀다.(코맥 매카시) 내게 신비란 타자와 나의 시차(視差)다. 세계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이야기하는 것만큼,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미래가 문학의 언어를 빌려 생성 중인 세계의 지도를 그려나간다. 그래서 이야기는 언제나 미래다. 이야기의 종말이 없다고 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무쉬의 영화에서 ‘아담’을 만나러 가는 ‘이브’는 ‘말로우’가 쓴 소네트*를 읽는다: 사랑은 최후의 날까지 살아남으리라. 만약 그것이 틀렸다고 증명된다면, 나는 결코 글을 쓴바 없고, 세상에는 사랑이 존재한바 없으리.
*소네트: 정형시(定型詩)의 일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