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서울대 상징을 만든 사람들
‘서울대’하면 떠오르는 상징들이 있다. “누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라는 구절은 그중 하나로, 학내 구성원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유명한 문구다. 이는 1971년 4월 2일에 열린 관악캠퍼스의 기공식에서 발표된 축시인 「여기 타오르는 빛의 성전이」의 일부다. 축시를 올린 이는 「저문 강에 삽을 씻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등의 시로 유명한 정희성 시인이다. 축시의 뒷이야기를 듣고자 『대학신문』이 정희성 시인을 만나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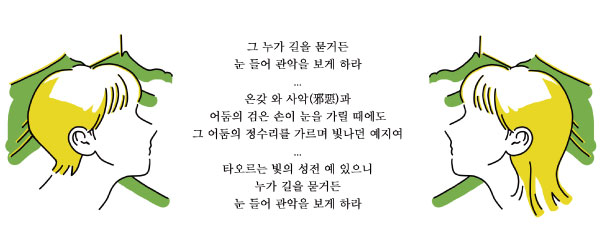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이었던 정희성 시인은 어떤 연유로 관악캠퍼스 기공식 축시를 짓게 됐을까. 1971년으로 시계를 돌려보자. 그때만 해도 문리과대학은 동숭동에, 공과대학은 공릉동에 있는 등 단과대들이 서울 곳곳에 산재해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단과대 대부분을 관악산 부지로 모은 것이 지금의 관악캠퍼스다. 기공식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참석할 만큼 성대하게 치러질 예정이었다. 이훈섭 전 건설본부장은 국어국문학과 교수였던 정한모 교수와 상의해 축시를 쓸 학생을 선정했고, 1970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정희성 시인이 축시를 쓰게 된 것이다.
정희성 시인은 “어느 날 차에 태우더니 골프장 건물만 남아있던 관악산 부지에 데려다 놓고 건설 계획을 설명해주면서 시를 써보라고 권유했다”라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정희성 시인은 축시를 완성하기까지 수없이 고민했다. 그는 “정한모 교수에게도 시를 보여드리고, 그의 조교였던 김재홍 교수와도 얘기를 많이 주고받으며 시를 매만졌다”라고 말했다. 정성스레 축시를 완성했지만 정작 정희성 시인은 기공식에서 축시를 직접 낭독하지 못했다. 경호팀에서 비표가 없다는 이유로 그를 기공식에 입장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급하게 교복을 입은 다른 학부생을 찾았고, 같은 과 후배가 축시를 기공식에서 대독했다.
정희성 시인은 성서를 자주 펼치면서 시상을 잡아나갔다고 말한다. 축시 1문단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듯이 관악의 이마에 흐르는 보배로운 기름이여”라는 구절 앞부분은 시편 133편 3절의 인용구다.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눈을 들어 관악을 보라”라는 구절은 첫 문단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도 등장한다. 정희성 시인은 “시를 쓴지 50년 정도가 됐는데, 그 구절이 가장 널리 알려진 시구가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인들이 매력적인 첫 시구를 찾지 못하면 시를 버리는 경우도 있다며, 첫 구절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예로 들면서, “매력적인 첫 구절을 써놓고 마지막에도 한 번 더 써먹는 것이 시인들의 상투적 수법”이라며 웃음을 보였다.
“눈을 들어 관악을 보라”라는 구절이 학생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한 마디를 남겼다. 조국의 미래가 서울대에 달려있다고 해석하면 긍지와 책임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서울대가 최고라는 뜻으로 읽으면 자만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학생들이 이 시에서 자기가 몸담은 대학에 대한 긍지를 느끼는 것은 좋지만 자만심에 빠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며 애정 어린 충고를 남겼다.
「여기 타오르는 빛의 성전이」는 학내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만한 축시지만, 여러 매체에서 서울대 학생의 자만심을 풍자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정희성 시인의 충고처럼, 이 축시가 우리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삽화: 김윤영 기자 kooki1026@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