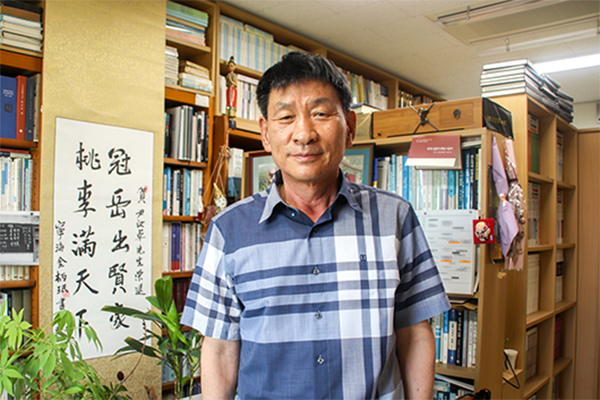
지난달 16일, 사범대(11동)에서 윤여탁 교수(국어교육과)를 만났다. 책장을 가득 메운 책들이 현대문학에 대한 그의 애정을 보여주는 듯했다.
Q. 현대시교육과 현대문학교육을 전공했다. 이를 전공하게 된 계기와 과정이 궁금하다.
A.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휴교로 1980년 10월 8일에 졸업을 했다. 당시에는 1학기가 4월 19일까지, 2학기가 10월 15일까지였다. 암울한 시대에 뭘 할까 고민하다 보니 학교 다니면서 안 봤던 책도 보며 공부를 했고, 대학원의 길을 알게 됐다. 교사와 대학원의 기로에서 고민하다가 대학원 시험 일주일 전에 교직 발령이 났는데 결국 학문의 길을 택했다. 대학원에 가서 현대문학을 하던 중에 남이 하지 않은 것을 하고 싶어 ‘카프’(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가동맹, KAPF) 리얼리즘 시에 뛰어들었다. 국문과에 교수로 취직하고 나서는 주로 리얼리즘 시를 연구했다. 이후 서울대 사범대에 와서는 학부 학생들이 중고등학교에 가서 시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석박사 과정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만나면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연구했다. 문학 연구자에서 현대시교육 연구자, 그리고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자로 변모하게 된 셈이다.
Q. 기억에 남는 연구 성과물이 있다면?
A. 박사학위 논문이 나를 끝까지 데리고 다닌다고 생각한다. 제목이 ‘1920년대와 30년대 리얼리즘 시의 현실 인식과 형상화 방법에 대한 연구’다. 당시에는 카프 문학을 쓴 작가들 작품은 구해 읽기 어려웠다. 백석 시인만 해도 현재 문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시인 중 하나이나, 당시는 그러한 서적을 갖고 있고 읽는다는 것 자체가 위법이었다. 공부에는 골방에서 정말 머리로 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뛰어다니면서 발바닥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논문을 쓰기 위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찾고 답사를 하며 오랫동안 고생을 했던 기억 때문에 박사학위 논문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다. 3~4년 동안 이렇게 길게 연구를 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박사학위 논문이 필생의 작업일 거라고 이야기하곤 한다.
Q. 해외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모국어로서의 ‘국어’를 가르치는 것과 또 다를 것 같다.
A. 외국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나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시를 가르치기 이전에 한국어를 가르쳐야 한다. 당장 우리 국어사와 문학사를 가르쳤을 때 이들이 이 내용을 한 번에 받아들일 확률이 매우 낮다. 그래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비교 문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했다. 김소월 시인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중국의 시인을 찾고 두 시인을 비교하며 설명하는 식이다. 언어 교육에 있어 말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국은 문화로 귀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문화 교육에 대해 책을 내기도 했다.
윤여탁 교수는 “인생은 세 단계로 이뤄진다고 본다”라며 “앞으로 다가올 세 번째 단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 전부를 천천히 곱씹어본 후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가려 한다”라며 퇴임 이후 삶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사진: 이호은 기자 hosilver@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