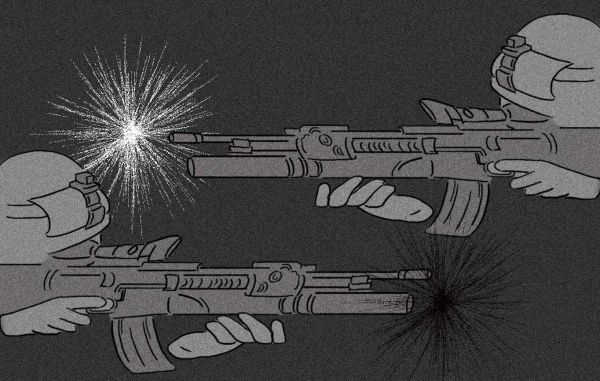
강산이 두 번 바뀐 터라 가물거리긴 하지만, 그 9월 11일 밤 일찍 잠들었던 것은 확실하다. 다음날 아침 등교해보니 친구들은 온통 “미국에 전쟁 났대!” 하며 웅성대고 있었다. 아닌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수업을 미루고 틀어주신 TV 화면에는 화염과 분노, 비통과 불안이 가득 차 있었다.
한 달 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를 공격한다고 했다. 이태 전 초등학교 4학년 꼬마를 겁주었던 노스트라다무스의 종말론이 뒤늦게 현실화되는가 싶었다. 초등학교 6학년이던 내 눈에 ‘국제정치’는 폭력·증오·울분으로 가득 찬 무대였다.
작년 이맘 때 박사과정을 시작하며 아프가니스탄 사람을 처음 마주하게 됐다. 온라인 수강이 계속되다보니, 입학 동기인 W와 개인적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5월에 이르러서였다. 가족들이 카불에 있다는 그는 매일 잠에서 깨자마자 고국(故國)에 테러가 일어나지는 않았는지, 부모님과 오누이들이 무탈한지 먼저 확인한다고 했다. 몸은 비록 타국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고국에 머물러 있다며 수업에 집중하기가 힘들다 했다. 미군 전면 철수를 앞두고 현지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고학력 유학파 여성인 자신은 살아생전 아프가니스탄 땅을 다시 밟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초등학생이 대학원생으로 진화(?)해 온 지난 20년 동안, 그토록 많은 인명을 잃고 그만치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가며 얻은 바가 이것인가? “만방의 인민들이 일체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삶을 영위하고 자식을 키울 수 있는 자유”를 수호하겠다던 개전(開戰)의 기치(旗幟)는, 조국에 돌아갈 희망마저 잃은 채 날마다 가족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잔혹한 현실로 귀결되었다.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 여기서 새삼 E. H. 카(Carr)의 명저 『20년의 위기』(The Twenty Years’ Crisis)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카는 제1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1919년부터 두 번째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돌던 1939년까지 20년의 세월을 ‘위기’였다고 규정했다. 세계대전의 참극(慘劇)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이상론적 사고가, 복잡한 권력관계로 점철된 국제정치의 현실을 도외시함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분석은, 초고가 완성된 직후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열리면서 ‘예언’으로 승격됐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르며 세상은 많이 바뀌었다. 소련 해체 이후 하늘을 찌를 듯했던 미국의 위세는 수그러들었고, 강압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산시키겠다던 이상론적 명분은 설 곳을 잃었다. 빗발치는 국내외의 비판을 무릅쓰고 자국군 철수를 강행한 만큼, 미국은 가면을 벗어던지고 대중(對中) 견제에 전력할 것이다. 짧은 배움에 기대어 볼 때, 지난 20년의 시간 역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조차 국제정치에 이상론적 목표를 강제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보여준 또 하나의 ‘위기’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까 감히 평가해본다.
그러나 W를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겪은 고통은 누가, 어떻게, 무엇으로 보상해줄 수 있을 것인가. 새 학기 시작을 맞아 W에게 안부를 물어보려 해도 선뜻 손이 가질 않는다. 박사과정 2학년생의 눈에도 ‘국제정치’는 여전히 폭력과 분노, 슬픔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비극 같기만 하다.
고용준 간사
삽화: 정다은 기자 rab4040@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