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생근 교수 불어불문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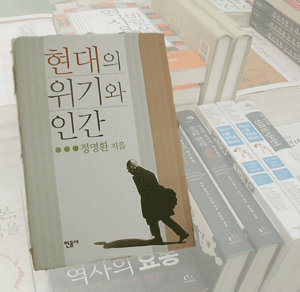
사르트르의 문학과 철학의 깊이 있는 연구자로 잘 알려진 정명환 교수가 최근에 『현대의 위기와 인간』을 펴냈다. 이 책에는 사르트르뿐 아니라 바타유, 퍼식, 로티, 하버마스, 푸코 등의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논의되어 있는 한편, 현대의 위기를 진단하고 이러한 위기에 대처해야 할 인문학의 역할과 인간적 삶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인문학자의 폭넓은 사유와 진지한 성찰이 담겨있다.
저자는 우선 “이성의 힘과 역사의 발전과 정신적 가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오늘의 상황을 위기로 파악하면서 이 시대에 인간과 인문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과 의미를 질문하고 천착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저자가 과장된 비관주의나 안이한 낙관주의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방향에서 사유를 전개하고 명징한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현재의 테크놀로지 사회에서 대중의 위력이 확산되고 예술의 존재가치는 무력해지는 현상에 대하여 저자는 대중에 절망하기보다 오히려 대중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계몽주의를 구상해 보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세계화 시대의 압도적인 문화산업의 흐름 속에서 인문학자는 조금도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군중 속으로 전락한 사람들을 인간으로 끌어올리고”, 반인간의 세력에 대항하며 “이론적 이의를 제기하고”, 실천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저자의 이러한 주장은, 사르트르의 『문학이란 무엇인가』에서 표명된 문학의 정치참여 주장을 비판한 글에서도 일관성 있게 표명된다. 저자는 예술의 존재의미가 “일상성이 은폐하거나 왜곡하고 있는 진실한 현실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깨어나게 하고, 주체의 해방을 자각하게 만드는데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이 책에는 이처럼 테크놀로지 사회에서 인간적 삶이 변질되고 인문학이 위기에 놓인 현실을 냉정히 진단하면서 새로운 출구를 모색하는 논문들 외에도 문학과 철학의 경계와 소통의 문제를 다룬 논문들도 여러 편 실려 있다. 이 중에서 서평자가 가장 흥미롭게 읽은 논문은 「사르트르의 낮의 철학과 바타유의 밤의 사상」이다. 저자는 두 사람의 논쟁을 상기시키면서 어느 한 쪽을 옹호하고 다른 한 쪽을 비판하는 관점을 취하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두 사람을 비교한다. 그 결과 사르트르의 합리주의적 입장에서는 바타유의 언어와 행위가 부조리하게 보였을 것이고, 합리주의적 사고를 전복시키려던 바타유의 입장에서는 사르트르의 이성적 철학이 답답하게 보였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바타유가 보수적인 생각이나 합리주의적 사유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했다는 점을 덧붙여 지적하기도 한다.
이처럼 원숙한 사유의 세계를 보여주는 논문 외에도 철학적 언어와 문학적 언어의 경계를 허물면서 전통 철학에 대한 근본적 반성을 시도한 로티를 긍정적으로 수용한 글과, 철학과 문학을 구별지으려 한 하버마스의 견해에 비판적으로 접근한 글 모두가 설득력 있게 서술된 논문들이다. 이 책은 결국 인간적 가치가 소멸되는 위기의 시대에, 사유의 힘과 정신의 깊이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을 주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지를 일깨워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