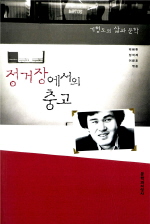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 … /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빈집」에서)
「빈집」의 시인 기형도를 그리워하는 이들은 끊임없이 그의 죽음을 회상한다. 그 기억의 조각들을 모은 『정거장에서의 충고』가 지난 7일(토) 출간됐다. 2009년 3월 7일은 그가 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째 되는 날이었다. 이 책에는 기형도 시인의 작품으로 문학적 감수성을 키웠다는 심보선을 비롯한 후배 시인들의 좌담 등이 실려 있다. 그들은 기형도가 남긴 문학사적 유산을 오롯이 증명한다.
그는 첫 시집을 준비 중이던 1989년 3월 7일 새벽, 종로의 한 심야극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른이라는 젊은 나이에 빼어난 시를 남기고 요절해버린 그의 생애도 그렇거니와 그의 텍스트가 죽음을 예견하고 있다는 사후 독해가 더해지면서 그는 신화라는 ‘검은 구름’에 둘러싸였다. 심보선 시인은 “기형도 신화로부터 벗어나서 기형도의 진실, 그저 놀랍도록 아름다운 시를 쓴 한 청년의 맨 얼굴을 바라보자”고 말한다. 그의 사연인즉, 신화 속에서 기형도의 작품을 접했을 땐 반감이 들었지만 그것을 걷어내자 그의 시가 하나의 텍스트로 다가왔다는 것. 기형도 시인이 시 속에 그려낸 죽음은 더 이상 “실존적인 조건 내지는 어떤 운명이기보다는 ‘은유적인 장치’로써” 작용했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성석제 소설가는 기형도의 생애를 생생하게 증언해 고인의 면모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 시인과 목욕탕도 같이 다닐 정도로 서로에게 숨김이 없었기에 성석제가 전해주는 얘기는 벌거벗은 몸처럼 솔직하다. 그는 시인이 세상의 빛을 본 1960년 3월 13일부터 시인이 세상을 등지고 떠난 1989년 3월 7일까지의 모든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세세하게 기록했다. 기형도 시인이 대학시절 교내 문학공모에 당선된 후 상금으로 세계문학전집과 수동타자기를 사고는 성석제 소설가에게 “너도 상금 받으면 먼저 책하고 타자기부터 사”라며 배부른 듯이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는 것도 그 기억 중 하나다. 그가 모아붙인 기억의 단편들 속에 나타난 기형도 시인은 여느 인간처럼 ‘누군가의 친구이자 동지이고 악당’이다.
성석제는 친구 기형도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해 했다. 기형도 시인은 자신이 잡담의 대상이 되는 것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인은 이러한 자신의 경향을 ‘추억에 대한 경멸’이라 칭했다. 시인은 추억이 그 자체로서 존재하지 못하는 추억의 변질성을 경멸했다. 그러나 우리가 제멋대로 기억하고 변형시킨 그에 대한 추억은 어느새 신화가 됐다.
이 책의 필자들은 고인에게 덧씌워진 신화라는 옷을 벗겨주고 있다. 태어난 순간처럼 벌거숭이가 된 그는 예전부터 말해왔듯이 자신 그 자체를 느껴달라고 말한다.
“내 희망을 감시해온 불안의 짐짝들에게 나는 쓴다 / 이 누추한 육체 속에 얼마든지 머물다 가시라고”(「정거장에서의 충고」에서)
서종갑 기자
shymissoni@snu.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