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에세이] 공포의 외인구단

이현세 지음┃세주문화┃각권 3천원
오늘 오전 11쯤 13세 소녀가 내게 날린 문자. “1-1 동점!”
3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대한민국 13세 소년소녀들은 학교에서 야구중계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2009 월드베이스볼클래식 결승전, 그것도 한일전이니, 나는 딸아이의 실시간 중계를 문자로 받아보면서
그럴 만도 하다고 생각했다.
198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낸 나로서는 ‘야구’ 하면 떠오르는 만화책이 있다. 이현세의 『공포의 외인구단』. 1983년에 1권이 나온 후로 30권으로 완결될 때까지 2년여 만에 무려 1백만권이 팔렸으며 영화로 만들어져 40만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들인, 한국만화사의 일대 사건에 속하는 만화책이다. 정수라가 부른 영화의 주제곡 ‘난 너에게’도 크게 히트를 쳤다. 순정파 까치는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의 정신, 이것이야말로 1980년대의 신화가 된 『공포의 외인구단』의 핵심 전언이었다. 사랑에 있어서도 야구에 있어서도, 또한 대한민국 고3에게도 대한민국 프롤레타리아에게도. 외인구단의 선수들은 모두들 하나같이 프로야구의 높은 벽을 넘기엔 턱없이 모자라는 찌질이들이었다. 그렇지만 무시무시한 지옥훈련을 ‘뭐든지 할 수 있다’의 정신으로 통과하면서 이들은 일약 프로야구계의 스타, 한국야구의 영웅으로 거듭난다. 이 같은 상승의 드라마에 우리는 왜 그토록 열광했던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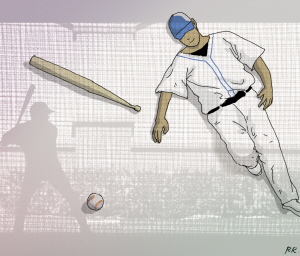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열광의 표면을 살짝만 들춰봐도 그곳에는 뭔가가 억압돼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데, 왜 나는 못 하는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좌우명이었고 고3 교실의 급훈이었으며 지금도 횡행하는 개발독재 시대의 강변이자 우리들의 무의식을 잠식한 한국형 이데올로기가 아닌가. 그 앞에서 사람들은 매일같이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 했다. 필요 이상으로 우리는 너무 많이 반성한 것은 아닐까. 할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엔 얼마나 많은 데 말이다.

박민규 지음┃한겨레신문사┃303쪽┃8천5백원
우리가 진정 반성해야 할 점은 할 수 없는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닐까. 박민규의 소설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에서 제안하는 “치기 힘든 공은 치지 않고 잡기 힘든 공은 잡지 않는다”는 야구 스타일과 철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이 소설은 삼미 슈퍼스타즈를 로고로 삼아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한다.
프로야구 원년 1982년에 탄생한 삼미 슈퍼스타즈는 프로야구계의 독보적인 꼴찌팀으로 3년 6개월을 버티다 지구에서 사라진 팀이다. 그렇지만 삼미의 야구는 평범하다면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 야구였다. “분명 연습도 할 만큼 했고, 안타도 칠 만큼 쳤다. 가끔 홈런도 치고, 삼진도 잡을 만큼 잡았던 야구였다. 즉 지지리도 못하는 야구라기보다는, 그저 평범한 야구를 했다는 쪽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그럼에도 수치스러운 꼴찌였다. 왜? “실로 냉엄하고, 강자만이 살아남고,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래서 아름답다고 하는” 프로의 세계였으니까. 삼미는 프로야구계에 뛰어든 아마추어 야구팀, 지구라는 행성에 떨어진 외계인(슈퍼맨이 삼미의 마스코트였다)이었다. “프로의 꼴찌는 확실히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인데, 이 세상이 이미 프로라면 이거 큰일이 아닌가.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은 프로의 논리 속에서 허우적대지 말고 그 바깥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유혹한다. 여기서 삼미 슈퍼스타즈는 프로의 세계에서 프로의 논리를 벗어나서 그들만의 야구를 실천한 야구단으로 기려진다.
그러나 치기 힘든 공을 치고(치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잡기 힘든 공을 잡는(잡으려고 기를 쓰는) 것보다, “치기 힘든 공은 치지 않고 잡기 힘든 공은 잡지 않는다”는 자세를 뱃속 편하게 나아가 즐겁게 실천하는 것이 웬일인지 더 어렵게만 느껴지진 않는가. 너무나 익숙한 경쟁의 구도에서 빠져나오는 데, 프로의 이데올로기로 훈육된 신체를 바꾸는 데, 어찌 불안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진짜 인생은 삼천포에 있다”고 하는군. “필요 이상으로 바쁘고, 필요 이상으로 일하고, 필요 이상으로 크고, 필요 이상으로 빠르고, 필요 이상으로 모으고, 필요 이상으로 몰려 있는 세계에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군. 잡초 덤불 쪽으로 빠진 2루타성 타구를 잡으러 갔다가 발견한 노란 들꽃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공을 던지는 걸 마냥 까먹고 있는 순간에 진짜 인생이 있다는군.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을 소망 충족의 이야기로 읽은 당신이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것도 야구라고 할 수 있나요? 박민규 식이라면, 야구로 불리거나 말거나. “재구성된 지구의 맑고 푸른 하늘” 아래서라면.
문제는 나의 야구를 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늘어놓은 야구 이야기는 인생 이야기였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똑같은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발휘해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제는 나의 인생을 발명해야 한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