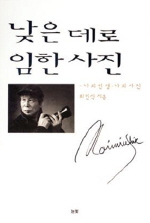
‘신문배달’은 1985년 부산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이 사진이 조용히 웅변하듯 그는 50년의 작품 활동기간 동안 ‘낮은 곳’에 일관된 관심을 보였다. 그의 인생과 사진을 담은 산문집 『낮은 데로 임한 사진』이 출간됐다. 그는 1957년 일본 도쿄 중앙미술학원을 졸업한 이후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을 사진에 담아왔다. 사진집 『인간』 시리즈는 1968년 제1집을 시작으로 2004년에 제13집까지 출간돼, 여든이 넘은 지금까지도 인간에 대한 그의 열정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는 소외된 이웃을 삶의 중심부로 끌어내기 위해 다큐멘터리 형식의 리얼리즘 사진 기법을 택했다. 그의 사진 속에 포착된 서민들의 모습에서는 독특한 질감이 느껴진다. 그는 어수선한 광경 속에 있는 서민들을 위태로워 보이는 구도로 포착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사진에는 서민들의 삶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소박한 힘이 담겨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가난한 사람들」에서 대도시 하층민의 생활을 진솔하게 묘사한 것처럼 그의 사진도 서민들 삶의 리얼리티에 헌신해왔다.
사진작가 최민식이 ‘낮은 데로 임하게’ 된 것은 그의 궁핍했던 시절의 기억 때문이었다. 황해도 이북 출신인 그는 불구가 된 아버지를 대신해 일곱 식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상경한 뒤에는 식당, 인쇄소 등에서 일했고 밤에는 미술학원을 다니며 고학했다. 그는 “가난은 사람의 영혼을 옭아매고 모든 희망을 수포”로 만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가난의 실상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시장의 아주머니, 어린이와 노인, 노동자 등 서민들의 생활 주변에서 허식 없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포착해낼 수 있었다. 그는 “찰리 채플린 영화의 주인공처럼 악의 없는 진실의 동공을 가진 인간을 포착하려고 애썼다”고 말한다.
그의 사진은 가슴을 깊게 울리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평을 듣곤 한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남루와 고통의 실상을 증명함으로써 위정자들의 반성을 촉구하고 그들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려했다”며 사진의 비판적 기능을 옹호한다. 하지만 그의 고발은 사람의 감정을 움직여 변화를 꾀하기에 정치적이라기보다는 문학적이다.
사진작가 최민식에게 사진은 아름다움을 좇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파헤치는 작업이다. 빛과 구도와 감정이 일치되는 순간, 그의 렌즈에 잡힌 피사체는 진실 그 자체다. 그에게 감정이란 ‘소외된 자들과의 교감’이고 그는 그들의 진실을 보기 위해 고개를 조금 숙였을 뿐이다. 낮은 곳에 임하면 진실은 스스로 제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서종갑 기자
shymissoni@snu.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