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시절 간직했던 열정
각박한 삶 속에 잃어가지만
시대적 과제를 고민하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 꿈꿔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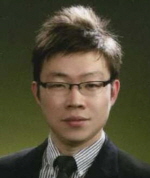
외교학과 석사과정
하루가 다르게 신록이 더욱 싱싱한 기운을 내뿜는 5월. 동기 T야, 오늘도 캠퍼스의 하루하루에 열중하고 있는지? 논문을 써보겠다고 학교와 연을 이어가고 있는 내게 어느덧 푸르게 변한 교정은 함께하고 있는 10여년간의 시간을 떠올리게 한다. 이는 우리의 지난 추억이, 풋풋했던 20대 초반이, 함께했던 푸르른 꿈이 캠퍼스 곳곳에 묻어 있기 때문이겠지.
02학번 사회대생인 우리의 학교생활은 처음부터 특이했어. 학부제 개시라는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각 반 자치학생회들도 새로운 발전 방향을 찾지 못할 때였지. 우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지 않니? 한쪽에서 통일을, 한쪽에서는 노동을, 또 한쪽에서는 학점과 고시를, 또 한편으로는 에라 모르겠다 스타크래프트와 연애를 외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부단히 고민했었잖아. 일부 선배들은 일방향적인 그네들의 이야기만 풀어놓기 일쑤였고, 그렇다고 소아(小兒)적인 재미만을 추구하며 보내기엔 ‘진보의 요람’ 사회대의 새내기로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아니냐는 눈빛을 나누던 그때가 기억 난다.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소위 ‘세계화류’ 정책들의 부작용,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제2차 북핵 위기의 시발, 눈감고도 보였던 한국정치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겁날 것 없었던 호기심 많은 대학 초년생의 마음을 불태웠던 것이지. 지금 생각하면 부질없던 것인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함께 제3의 길을, 칼 폴라니를 읽고, 클린턴과 블레어의 중도 노선을 신나게 토론했었다.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가 젊음의, 우리 대학 생활의 전성기였던 것 같아. 조직 생활이라는 피곤함 앞에 초년의 야망을 떠올리기보다 고개부터 숙이게 되는 요즈음이니까. T야, 너도 그렇지 않니?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1점에 집착하고, 고시생 생활에 지쳐 학문을 잃어버리고, 포용하는 마음보다는 이유 없는 경쟁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원자화된 개인의 하루하루 일상에만 천착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도 가슴 한구석에는 해야 할 것을 못하고 있다는 기분이 드는 것. 이것이 기성사회의 높은 벽에 때로는 좌절하면서도 개선을 꿈꾸고, 스펙 쌓기에 혈안이 돼 ‘사회는 사회, 학교는 학교’라는 분위기가 팽배한 오늘의 캠퍼스 분위기에 실망하곤 하는 우리들의 자화상인지도 모르겠다. 한 때 찬반에 관계없이 이라크 전쟁 반전 시위를 멋들어지게 벌여봤고, 오늘의 축제문화를 만들어낸 주역들이 바로 우리 세대이기에.
T야, 어쩌면 이런 어색한 모습이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던져주는 것인지도 몰라. 생각보다는 우선 행동이 중요한 시대를 살았던 저 멀리 선배들보다는 유연하고 섬세하며, ‘88만원 세대’라고 낙인이 찍혀, 행동하기보다는 일단 수용해버리는 후배들보다는 지적으로 훨씬 발랄하니까. 절차적 민주주의 달성을 넘어 이를 채울 콘텐츠를 고민해야 하고, 한반도와 동북아를 따라가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선도하는 국제정치를 모색해야 하며,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선진화를 구현해야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은 우리들이니까.
친구들아. 불투명한 대학원 생활이지만, 지연되는 사회진출에 초조한 요즈음이겠지만, 그리고 마지막 고시가 주는 압박감에 지쳐가겠지만, 그래도 꿈을 꾸자. 대학 초년 아무 것도 없던 너와 내가 나누어 아직도 마음 한 편에 살아 숨 쉬는 생명력을 간직한 채. 포기하기엔 아직 푸르고 싱싱 해야 하는 우리이니까. 5월의 저 반짝이는 신록들처럼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