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로잉의 세계, 세계의 드로잉」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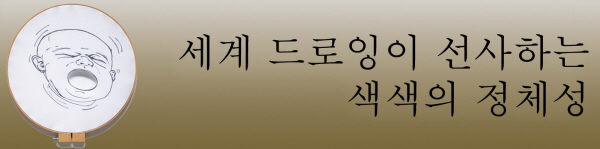
MOA 미술관에서 오는 25일(수)까지 「드로잉의 세계, 세계의 드로잉」전이 열린다. 여러 국가의 드로잉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비교해보는 이번 전시에는 서울대와 교류협정을 맺은 호주의 RMIT 미술대학, 영국의 런던미술대와 브라이턴대, 독일의 할레 미술대와 베를린예술대, 일본의 동경예술대, 그리고 대만의 대만예술대 미술학원 등 6개 국가 8개 대학 교수들이 출품한 100여 점의 작품이 소개된다. 이번 행사를 진행한 윤동천 미대 부학장은 “교류대학 간의 작품 비교를 통해 포착되는 차이점에서 각 나라의 다양한 작품 경향과 정체성을 알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대만이나 일본 작품은 전통적인 동양화를 발전시키거나 현대적으로 변용한 작품들이 많다. 일본작가 사이토 모리히코의 「summer mountain」은 전통적인 수묵화에 연분홍의 색채를 가미해 현대적 느낌을 살렸고, 대만작가 린친청의 「閒情」은 전통적 수묵화의 기법으로 소를 그려내 향수를 자아냈다. 대체로 구상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며 추상적 작품이라 직선이 창살처럼 보이고 그 건너 푸른 물감이 하늘을 연상시키기도 해 추상과 구상의 경계가 모호한 작품들이 많다.
한편 호주 작품은 매우 대조적인 두 경향을 제시했다. 돈 고어의 「Bowl, Handle with Care」같이 충분한 여백을 남기고 그려내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내는가 하면 고드윈 브래드비어의 「cameo cosmetica」 은 극사실적인 배경 위에 단순한 직선들이 가로질러 기하학적인 형태와 추상적인 형태 사이의 대비를 보여주는 드로잉도 제시됐다.
한국은 주로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했다. 전통적 수묵화의 선을 강조한 김병종의 「소년의 얼굴」부터 먹지와 서구적 드로잉의 결합을 시도한 신하순의 「a walk」, 수많은 붓터치가 모노크롬의 색조로 표현되는 김춘수의 「ultra-marine 0930」 등 총 14개의 한국적인 드로잉 작품이 전시된다.
색색의 정체성이 빛을 발하는 ‘세계의 드로잉’과 무수히 다양한 기법과 재료로 거칠거나 부드럽게, 투박하거나 예리하게 화가의 정서를 표현하는 드로잉의 세계에 심취하면 드로잉은 더 이상 밑그림이 아니다. 드로잉은 작가가 화폭에서 마주하는 세계를 표현하는 ‘핵심’이자 ‘과정’, 그리고 ‘작품’이 된다.
<문의: MoA 미술관(880-9504)>
박은규 기자
dmsrb6196@snu.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