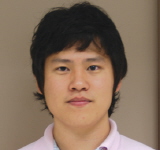
“이름이 절대 나오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노동자들이 인터뷰의 조건으로 기자에게 신신당부 했던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서울대에서 고용승계란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직감할 수 있었다. 현재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것조차 매우 조심스러워 한다. 학교와 노동조합이 내부 사정을 발설한 것을 알게 됐을 때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이 두렵기 때문이다.
“점심값만 좀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어느 노동자가 1,700원 짜리 점심만 제공되도 지금보다 생활이 훨씬 나아질 것이라며 기자에게 한 부탁이다. 그들도 아마 내가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내게 끝까지 점심값을 부탁했다. 문득 친구 가어제 구했다는 아르바이트가 생각났다. 친구는 전화상담 아르바이트가 시급 7천원에 점심값 4천원을 제공한다고 했다. 무엇이 그들에게 1,700원짜리 밥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학생들은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또다른 노동자가 내게 한 질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었나? 그들이 화장실 옆 조그만 창고를 개조해 휴식공간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대자보가 붙고 나서야 ‘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하고 새삼스럽게 놀라지 않았나. 한 시설노조 창립멤버는 당시 노조를 창립하고 총파업을 할 때 총학생회가 시설노동조합대책위원회를 꾸려 파업을 적극 지지했던 일을 회상하며 학생들 덕에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이나마 보장받게 됐다며 고마워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들의 존재를 새카맣게 잊고 있던 내가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을 자격이 있나’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지난달 11일 오연천 총장은 취임식에서 “서울대가 자신을 낮추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심성을 갖춘 바른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후보시절에도 『대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부생의 인성교육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학생들을 국제 봉사단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학교에 묻고 싶다. 당장 내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조차 무관심한데 개발도상국에 국제봉사단을 파견함으로써 얼마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따듯한 심성을 갖춘 바른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