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와의 대화] 시인 이영광'미친’ 죽음을 낳는 뒤틀린 사회현상 앞에 서정의 옷을 벗은 저항시인으로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요구와 분노에 스며든 시적 고뇌
반쯤 얼어터진 봄이 다 가도록 / 사람 죽여 원혼 만들고 … 대한민국이여, 겨우겨우 키운 좆 움켜쥐고 / 사창가로 쳐들어가는 취한 수컷 같구나’(「대(大)」中). ‘육두문자’ 안 가리고 대한민국을 호통 치는 성난 구절 때문일까. ‘투사’의 열변을 기대했던 기자에게 시인의 순박하고 느릿느릿한 말투는 예상 밖이었다. 시끄러운 잠실역 근처 한 중국집, 당황하는 기자를 앞에 두고 이영광 시인은 소주부터 한병 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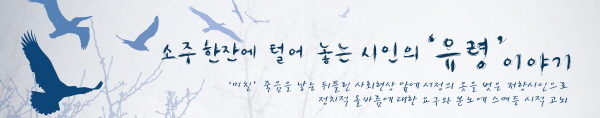
‘가슴 떨리던’ 시인, 이젠 ‘치가 떨린다’
1998년 「빙폭」 외 9편의 시로 『문예중앙』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한 이영광에게는 ‘정통 서정시인’이란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첫 시집 『직선 위에서 떨다』(2003, 창비)에는 곱고 섬세한 문체로 표현된 연정이 군데군데 묻어나온다. 「나팔꽃」에서 ‘그대를 망설이면서도 징하게 닿고 싶던 그날의 몸살’로 피어난 사랑의 열병은 ‘사랑이란 가시나무 한그루를 알몸으로 품는 일 아니겠느냐’는 가슴 떨림으로 끝을 맺는다. 2008년 시 「물불」로 노작문학상을 수상할 때까지만 해도 이영광은 사랑과 아픔에 천착하는 전형적인 서정 시인이었다.
하지만 웬일일까. 시인은 지난 8월말 출간된 『아픈 천국』(2010, 창비)에서 서정시의 숲에서 뛰쳐나와 뒤틀린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죽도록 공부해도 죽지 않는다, 라는 / 학원 광고를 붙이고 달려가는 시내버스 … 죽도록 해야 할 공부 같은 건 세상에 없다 / 저 광고는 결국, / 죽음만을 광고하고 있는거다’(「죽도록」中). 시인이 ‘날선’ 목소리로 꾸짖는 대상은 죽음으로 치닫는 입시 경쟁만이 아니다. ‘부자를 찍어 옥좌에 앉히고 / 국회로 보낸다 / 우리를 짓이겨버리세요 / 네가 날 살려주지 않으면 / 내가 날 확, 그어버리겠어요’(「무소속」中). 그는 왜 갑자기 국회가 ‘흉기 없는 살인’을 자행한다고 절규하게 된 것일까.
원혼으로 가득 찬 죽음
시인은 사회 곳곳에 널린 애도할 길 없는 원혼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회고한다. “IMF 경제 위기 이후 많은 사람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생업을 박탈당했지요. 그 중 많은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그는 현 정부가 집권한 3년의 세월을 ‘악화일로(惡化一路)’라고 표현했다. “작년 벽두부터 공권력 남용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일어나더니, 전직 대통령이 자살하고 뉴스에선 연일 살인 사건이 보도됐지요. 탈출구도 없고 애도의 겨를도 없는 괴로운 죽음의 연속이었던 셈이에요.”
그가 사회의 ‘괴로운’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애도하게 된 데는 혈육을 잃은 상처가 도화선이 됐다. “박사 논문을 쓰고 있던 2005년 무렵 아버지와 형이 연이어 세상을 떠나면서 오랫동안 실의에 빠졌지요.” 굿판을 돌아다니고 불교나 기독교의 가르침에 의지하려고도 했지만 결국 그에게 돌아온 것은 상실의 고통과 허탈함뿐이었다. 이후 뉴스에서 들려오는 사망 사건은 시인에게 더이상 숱한 ‘뉴스거리’ 중 하나로 들리지 않았다. “한 사람의 목숨이 사라지는 죽음 자체도 아픈 일인데, 우리 사회에는 정상인이라면 납득할 수 없는 ‘미친’ 죽음이 한둘이 아니에요.

형체 없는 형체를 그리다
우리 사회가 ‘아픈 천국’인 것은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는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그가 이번 시집에서 가장 애착을 갖고 썼다는 연작 「유령」에는 폐지 수집으로 연명하는 노인, 여성대리운전사 등 우리 사회의 변두리를 배회하는 소외 계층이 등장한다. ‘시든 폐지 더미를 리어카에 싣고 / 까맣게 그을린 늙은 유령은 사방에서 / 천천히, / 문득, / 당신을 통과해간다’(「유령1」中). 무시되고 외면당하던 사회적 약자는 마침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이 된다. 이를 보면 꼭 기형도의 「안개」가 떠오른다. 기형도의 시에서 ‘안개’는 산업 사회의 모순을 희뿌옇게 덮어버리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그 속에 숨은 산업화의 비인간성이 부각된다. 시인은 “왜곡된 모습을 보지 못하게 가리는 것이 ‘안개’라면, ‘유령’은 왜곡된 모습 그 자체”라고 말했다. 이영광의 시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뒤틀린 존재들에 대한 항의이자 폭로다. “서로는 서로에게 유령이라는 사실, 형체 없는 유령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의 실체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지요.”
사회적 약자가 ‘보이지 않는 유령’이 되는 세태의 원인으로 그는 ‘서로를 죽이려는’ 비정상적 광기에 가득찬 경쟁 심리를 꼽는다. “모두가 나만 살자는 생각에 혈안이 돼 있다”며 운을 뗀 시인은 “‘다른 사람을 짓밟더라도 나부터 살아야지’라고 되뇌는 순간 소수자는 ‘유령’이 되고 만다”고 성토했다.
유령을 보듬는 ‘부끄러운’ 시인
이처럼 모순덩어리 사회를 질타하는 그의 시에는 비판보다 부끄러움이 더 진하게 묻어있다. 시인이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황지우의 시 「새들도 세상을 뜨는 구나」에서 ‘나’는 부당한 독재 권력에 ‘낄낄대며’ 야유하지만, 결국 그 속에서 실천적 행동을 옮기지 못한 채 무력한 지식인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주저앉는다’. 어쩌면 이영광도 황지우만큼이나 저항시 속에 자기반성을 담는 시인이 아닐까. 시인은 “황지우 선생의 시에 보이는 고뇌와 반성은 나와는 급이 다르다”며 황급히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시인은 이미 누구보다 치열하게 시대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있었다. ‘…다만 무성한 속절의 나날에 대하여 나는…괴로워했으므로 다 나았다, 라고 말할 순 없을까.’라는 「아픈 천국」의 구절에서 시인의 고뇌와 부끄러움을 엿보았다는 기자의 고백에 그는 묵묵히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같이 괴로워해주는 것 그 자체가 약이 될 수는 없을까요. 괴로워한다고 그들의 괴로움이 낫는 건 아니지만 그조차 하지 않는다면 영영 나을 수 없으니까요.” 분명히 존재하나 사람들의 마음에서 잊혀진 ‘유령’이 떠도는 사회를 보듬고 싶다는 시인은 「유령」 후속편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그는 담담히 마지막 잔을 털어 넣으며 당부했다.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려, 나의 아픔과 남의 아픔이, 보는 방향은 달라도 그 크기는 같다는 걸…” 「유령」4, 5, 6, … 우리가 진정 아파할 때까지 「유령」연작은 몇 편이고 계속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