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언론 ‘국격’ 운운하지만
국가의 격식은 판단할 기준 없어
국력 상관없이 대등한 권위 알고
터무니없는 ‘국격’ 평가 지양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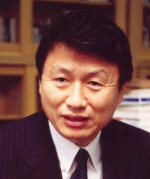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국격’이라는 말이 사전에 등재돼 있지 않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국격’이라는 말을 하나의 구호처럼 내세운다. 대통령의 연설 가운데 이 말이 자주 등장하더니 국가브랜드위원회라는 곳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캠페인을 벌인다고 한다. 지난해 G20 정상회의를 전후해 한국이 아시아의 변방에서 벗어나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됐다고 자랑하는 가운데 ‘국격’이 높아졌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모든 신문이 크게 전한 바 있다. 대통령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말씀이 되고 보니 관리들도 이를 따라한다. 국무총리도 ‘국격’의 제고를 강조하고 장관들도 ‘국격’을 들먹인다. 이렇게되니 너도나도 ‘국격’ 높이는 일에 나설 수밖에 없다. 어느 국회의원은 아프간에 한국 군대를 파견하는 것도 ‘국격’을 높이는 기회라고 강조한다. 월드컵 거리 응원 후에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치우는 시민의 모습을 취재한 기자가 이것이 ‘국격’이 높아진 증거라고 덩달아 쓴다. 연평도 포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격’이 땅에 떨어졌다고 탄식하고 소말리아 해적을 물리친 것을 두고 ‘국격’을 세운 일이라며 야단이다. 심지어 미술 경매장에서 호가되는 그림값도 ‘국격’에 비례한다고 말하는 이까지 생겼다. 방송과 신문도 별 생각없이 이 말을 그대로 따라 쓴다.
사물의 경우, 그 격식을 따지는 일이 자연스럽다. 물건에 따라 품질의 높낮이가 있고 크기와 가격이 다르며 그 품격에서도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모든 제도와 문물은 그것을 만들고 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그 격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 품격을 따질 수 있다. 고품격의 문화를 자랑할 수도 있고 저질의 습성을 비판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물의 격식을 따지는 것처럼 국가의 격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잘못이다. 국가는 물건이 아니다. 국가의 격을 어떻게 높이고 낮출 수 있단 말인가? 봉건시대의 전제 군주라면 몰라도 누가 이런 발상을 할 수 있겠는가? ‘국격’을 논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한국의 국가적 위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한국인들은 그동안 ‘국격’이 낮은 나라에 살고 있었는가? 대한민국은 서구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국격’을 지닌 형편없는 나라였는가? 대체 어느 나라가 ‘국격’이 높고 어느 나라가 낮은 ‘국격’을 지니고 있는가? ‘국격’의 높낮이를 따지는 기준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그것을 판별하는가?
모든 국가에는 국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국체(國體)가 있다. 국가의 힘이 강하면 강대국이 되고 힘이 약하면 약소국이 된다. 그러나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자기네들이 속한 국가에 최고의 권위와 가치를 부여한다. 국가는 그 안에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절대적 의미를 지니며 스스로 그 국가적 위의(威儀)를 자랑한다. 그러므로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국체가 다르고 국토의 크기가 차이가 있고 빈부의 격차를 지니지만 그 권위는 대등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국격’이라는 말이 사전에 오르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강대국인 미국이나 중국이 ‘국격’이 높고 약소국인 동티모르 같은 나라의 ‘국격’이 낮을 수는 없는 일이다. ‘국격’이 낮은 국가가 있고 ‘국격’이 높은 국가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다. 이것은 사람에게 개인마다 다른 품성이 있지만 인격의 높고 낮음을 구분하지 않는 이치와 마찬가지다. 그런데 국민들이 자기네 국가의 격이 높으니 낮으니 하고 떠들어대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을 놓고 말도 되지 않는 ‘국격’을 논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