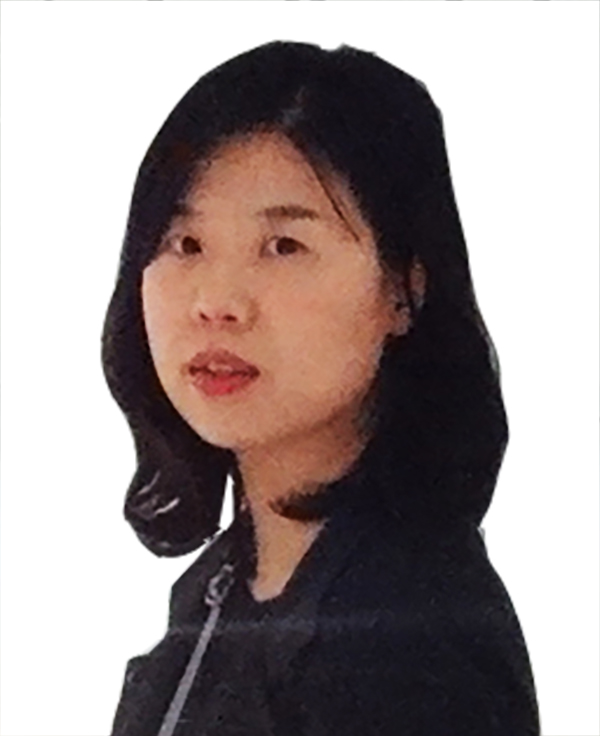
전시 오프닝 전날. 심장이 쫄깃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초청장에 박힌 대로 당장 다음 날 오후 5시가 오프닝이지만, 전시장은 여전히 아수라장이다. 그러나 ‘어찌됐건 전시는 열린다’는 속설(?)대로, 제 시간에 설치가 완료되지 못할 것 같은 전시도 무사히, 때로는 멋지게 오픈을 한다.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빈 전시 공간을 화이트큐브라 부른다. 비록 지금의 미술 상황에서는 재료 및 형식의 다양성과 미디어의 변화로 인해 이 화이트 큐브의 의미가 과거와 다르다 할지라도, 여전히 화이트 큐브는 큐레이터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텅 비어있는 전시장을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인가 상상하는 것은 마치 하얀 도화지에 처음 그림을 그릴 때처럼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우연히 연극의 뒷 무대를 볼 기회가 있었다. 그때 나는 판타지 세계에서 빠져나와 현실과 마주하는 충돌을 느꼈다. 이러한 기분은 연극 자체보다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에 더 흥미를 느끼게 했다. 나에게는 전시를 준비하는 것 역시 현실과 판타지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을 준다.
전시의 현실과 판타지 사이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대 미술관에서는 전시 ‘Love Impossible’전이 열렸다. ‘Love Impossible’은 인간 사이의 만남에서 결정되는 권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나는 이 전시에서 권력이라는 진부한 키워드를 사랑이라는 이질적인 요소 안에 녹여 넣고 싶었다. 키워드를 바탕으로 대략의 주제가 결정되면, 그 이후부터는 지루한 리서치 작업과 연구의 연속이다. 주제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이론적 배경을 찾아보고, 이에 걸맞은 작가들을 리서치하기 시작한다. 전시 작가가 정해지면, 작가와의 컨택을 시작한다. 작가의 작업실로 찾아가 널브러져 있는 작업들을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작업실의 한 쪽 귀퉁이에 붙어있는 낙서조차 스튜디오라는 환상의 공간에서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은 것처럼 보인다.
작품이 추려졌으면 이제 작품 전시 구성을 해야 한다. ‘Love Impossible’의 경우, 전시를 보는 것이 한 사람을 만나 서로 알아가는 만남의 과정으로 읽히도록 구성하고 싶었다. 작품을 전시장에 배치할 때는 전시의 스토리텔링뿐 아니라 관람객의 동선, 전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다. 작품의 높낮이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도록 작품을 배치하지만, 이 전시에서는 유난히 높게 걸린 작품도 있었다. 그 작품은 전시장을 들어가자마자 마주치는 이우성 작가의 ‘강한 메롱’이다. 이 작품은 남자의 눈과 입에서 혀가 나와 누군가를 조롱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 나는 의도적으로 작품을 높게 걸어 관객이 작품을 올려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객을 시선싸움의 패배자로 만들며 작품에 권위를 부여해 전시의 주제를 표현하고자 했다.
이제 전시 작품을 미술관으로 들여와 작품을 설치하는 일이 남았다. 가장 긴장되면서도 재미있는 단계다. 작품을 작가의 작업실에서 미술관으로 옮겨 오기 전에 작품 상태를 체크한다. 추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파손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박물관 보험에도 미리 가입을 한다. 아무런 사고 없이 전시가 마무리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아무리 조심해도 가끔은 전시 중 혹은 작품 이동 중에 사고가 나기도 한다. 작품을 설치한 후, 마지막으로 작품의 명제표를 붙이고, 아수라장이 돼 있는 전시장을 정리한다.
전쟁과도 같은 날들을 거친 후 오프닝 날이 되면, 큐레이터로서 나는 말끔히 차려입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관객을 맞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