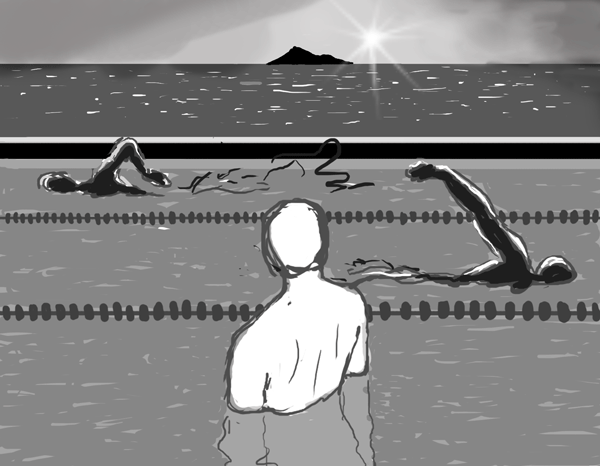
지난 1944호에 실린 ‘대학신문을 읽고’를 읽고 흠칫했다. 글 내용 중에 『대학신문』에서 ‘마로니에’가 ‘영영 회복될 수 없는’ 즉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쓰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약간 의아하긴 했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독자 입장에선 지난 학기까지 잘만 나오던 마로니에가 이번 학기 들어서 갑자기 아무런 언급도 없이 사라졌고, 또한 지난 백지발행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 흐름을 볼 때 마로니에 또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없어진 거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마로니에는 『대학신문』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로 인해 ‘중단’된 것이 맞다. 다만 영영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변명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마로니에를 집필하는 신문사 간사직이 정상화될 다음 학기부터 마로니에는 다시 예전처럼 지면에 등장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 생각은 참으로 안일했던 것이었다고 지금에 와서 느낀다.
중단되기 전 마지막으로 마로니에가 지면에 실렸을 때가 작년 11월 말이었고, 지금이 어느덧 5월 말이다. 방학에는 신문이 나오지 않으니 실질적으로는 2월 말부터 5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마로니에는 『대학신문』 지면에서 모습을 감추었다. 3개월,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을 생각해보면 그저 짧은 기간이라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였다.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사안이 학내외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많은 일들이 지난 3개월 동안 일어났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마로니에는 단 한 번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대학신문사 간사실 책꽂이에는 ‘마로니에’라는 제목의 이름 그대로 예전에 실린 마로니에 내용 중 일부를 엮어놓은 책이 꽂혀 있다. 만약에 이러한 책이 다시 한 번 나왔을 때 이처럼 중요한 시기를 다룬 글이 단 한 편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현 『대학신문』 간사로서 부끄러울 따름이다.
시기의 중요성을 차치하고서라도 마로니에는 그 자체로 큰 의미를 지닌다. 마로니에는 주제에 제한도 없고 분량도 많지 않으며 그렇다고 첨삭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신문에 실릴 글을 직접 쓰면서 기사에 이른바 ‘칼’을 대는 일을 하는 간사라는 입장에서 잊기 쉬운 기자들이 기사를 쓰며 느끼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마로니에는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하는 간사가 자신을 드러내고 독자와 글을 통해 소통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물론 직접적인 피드백이 온 적은 거의 없지만 마로니에를 쓰면서 내 글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읽힐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며 독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다.
생각해보면 간사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별 다른 고민 없이 마로니에를 중단했던 것도,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도 나도 모르게 독자의 존재를 외면했기 때문이었다. 신문사라는 좁은 공간에 갇혀 회의를 하고 글을 고치고 지면을 확인하는, 그런 일들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자칫 신문 제작 과정 자체에만 매몰돼 정작 중요한 독자의 존재를 잊기 십상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대학신문 구성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대학신문』을 만드는 것은 기자를 비롯한 대학신문 구성원이다. 그러나 독자가 없다면 신문은 존재할 수조차 없다. 『대학신문』이 독자의 존재를 잊지 않도록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질책을 부탁드린다.
여동하 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