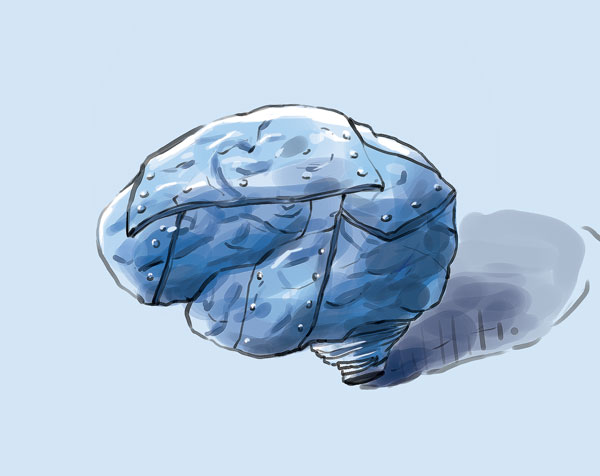
지난 8월 말까지 모처에서 진행된 흥미로운 전시회가 있었다. X-ray 촬영 방식으로 사물의 내부 속성을 표현한 사진전이었는데, 사람, 꽃, 스마트폰,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대상이 다양했다. 사진들이 은은하게 뿜어내는 빛에 매료돼 있던 중, 사람과 로봇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투시된 사진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섬세하게 짜인 인체 골격도 인상적이지만, 옆에 선 로봇의 정교한, 아니 더 완벽하게 대칭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에 순간 신인류와 조우한 듯 했다.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의 멸종위기론이 문득 망상 아닌 먼 미래로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전시회장을 돌던 걸음을 멈추고 머리에 하나의 질문이 맴돌았다. ‘X-ray로 희미하게 투시된 저 뇌가, 인간만이 가진 게 아니라면?’
사람처럼 생각하는, 즉 마음(Mind)을 가진 기계를 개발하는 것은 수십 년간 인공지능 학자들이 그려온 목표였다. 1950년대부터 인지과학자들의 논쟁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기계가 아닌, 궁극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가진 기계에 이미 방점이 찍혀있었다. 알파고가 세계랭킹 1위 바둑기사를 꺾었던 사건은 어쩌면 그들에겐 청사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기계의 마음’에 대한 기술적 가능성 이전에 개념적인 의문을 던진 사람이 있었다. 1980년 美 존 서얼 교수는 컴퓨터가 프로그램과 정보처리를 통해 인간 사고과정의 시뮬레이션을 모방해도 그것이 마음 ‘복제’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마음은 결국 뇌의 신경생리학적 과정인데, 프로그램을 이용해 뇌의 변화무쌍함과 무궁무진한 능력을 복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말하자면 프로그램(마음)이 하드웨어(뇌)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몸-마음 이원론의 반대편에서 인간 마음의 독자성을 역설한 것이다. 이는 당시 ‘인공지능 연구 초기부터 너무 앞서 나간 걱정이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기계의 마음을 기술적으로 논할 수 있게 된 현 시대에 다시 돌아볼만한 질문이다. 잠든 순간까지도, 매순간의 자극으로 100억 뉴런들의 시냅스 작용과 신경망의 소멸, 발달이 일어나는 뇌에 버금가는 인공두뇌가 가능할까? 생각하는 시뮬레이션을 따르는 기계가 아닌, 환경 자극을 받아 스스로 성장하고 시뮬레이션을 뛰어넘어 성장하는 기계 말이다.
아직은 인간의 뇌조차 베일에 가린 부분이 무수하기에 그것은 요원하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뮬레이션으로 설명 불가능한 마음의 복잡성을 자주, 습관적으로 평가절하하거나 그 변화의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만다. 범죄사건의 가해자가 뒤틀린 내면 감정을 그토록 잔인하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출하기까지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어떤 자극들을 구체적으로 경험해왔는지는 늘 뒷전이다. 조현병이냐 아니냐로 갑론을박하며 정신장애 진단명 하나에 그 사람의 모든 서사를 가두기도 하고, ‘무거운 형벌’이라는 사후 대처를 마치 마음과 행동을 일률적으로 사전 통제할 수 있는 최고의 처방으로 여기기도 한다.
유전론과 환경론은 해묵은 논쟁이지만 적어도 하나 경험적으로 검증돼 온 것이 있다. 인간의 두뇌 그리고 마음은, 날 때부터 장착된 시뮬레이션으로 평생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기계가 인간의 마음의 작용을 여태 복제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했다. 인간은 잠든 순간까지도 학습하는 존재이고, 가정과 학교라는 환경에서 주어지는 자극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성장한다. 그러한 전제를 스스로 버린다면 범죄가 애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더불어 기계가 인간을 따라잡을지 모른다는 상상 또한 실현 가능한 미래가 될지도 모른다.
김빈나 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