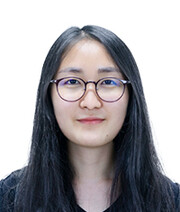
친구와의 밥·카페·술 약속, 게임과 인스타그램, 넷플릭스와 유튜브…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는 놀이 문화다. 방학 중 기획회의를 하며 한 기자가 “과연 우리는 이런 활동을 할 때 진정으로 즐거움을 느끼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지금까지 우리 삶에서 ‘놀이’는 논의의 주제가 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늘 일과 학업에 있었고, 놀이는 어쩌면 그 사이의 여가 시간을 때우는 수단에 불과했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특집 기사를 준비하며 놀이학 연구자들과 학부생 인터뷰이들, 그리고 청년 문화공간을 운영하시는 기획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청년 놀이 문화에 대한 여러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었다.
청년의 놀이 문화가 위축되고 상품화·획일화된 것은 단순히 문화 영역에 국한된 문제나 매체의 발달, 세대적 특성 때문에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청년의 놀이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한국사회와 놀이의 인문학」(김겸섭, 2014)에서 저자는 놀이학의 목표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노동 윤리 속에서 상실된 인간 고유의 총체적 잠재 능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흔히들 이전 세대와 달리 현대의 20·30 청년은 성장주의와 돈이 아닌, 워라밸과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전히 청년들은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노는 것은 태만이고 열심히 공부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인식을 주입받는다.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재미’를 찾고 잘 놀 수 있는지 배운 바가 없으니, 청년의 놀이가 타인의 놀이를 모방하는 식으로 주로 이뤄지거나 상품화된 놀이 문화에 빨려 들어가는 현상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청년 놀이 문화에 직격탄을 날렸다. 대학 공동체의 약화로 인해 각자도생하는 문화가 퍼져 있는데다, 코로나19는 청년들을 대학이라는 물리적 공간에도 모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대학 문화의 실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는 『대학신문』이 지난 2일(화)부터 9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여가 시간은 증가했지만 무엇을 하고 놀아야 할지 몰라 시간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선택지가 많은 공감을 받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물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청년들은 그들 나름의 혼자 노는 법과 비대면 상황에서 함께 노는 법을 발굴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괜찮아마을’ 홍감동 대표의 인터뷰처럼 청년들이 힘든 순간에 마음 편히 기댈 수 있고, 현실에서 잠정적으로 벗어나 함께 신명나게 놀 ‘고향’과 같은 공동체의 회복이 절실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더해 기존의 놀이가 지루하고 따분하다는 생각만 하고 있던 내게 많은 취재원이 들려준 이야기는 “그마저도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라는 것이었다. 놀이가 자본, 사회와 밀접하게 결합하면서 청년들 사이에서는 “만족할 만한 문화시설이 서울에 있어 자주 가기에 거리가 부담된다” “놀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재밌는 전시회나 방탈출 카페는 경제적 부담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놀이에서조차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양극화된 성장주의 사회에서 벗어나 문화 사회, 여가 사회로 나아가야 할 때다. 특집을 준비하며 이런 부분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전공하는 미학이 이런 ‘유희하는 인간’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데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성공한다 해도 우리 삶을 진정으로 즐길 수 없다면, 놀면서 우리 스스로가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떤 가치가 있을까? 이번 주 『대학신문』은 능력주의 기획을 통해 우리 사회에 팽배한 능력주의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진다. 독자들이 『대학신문』을 통해 더 이상 청년들이 능력에 따라 재단되지 않는 사회, 누구나 마음껏 다양한 놀이를 즐기며 인생을 다채롭게 꾸려나가는 사회를 상상해볼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