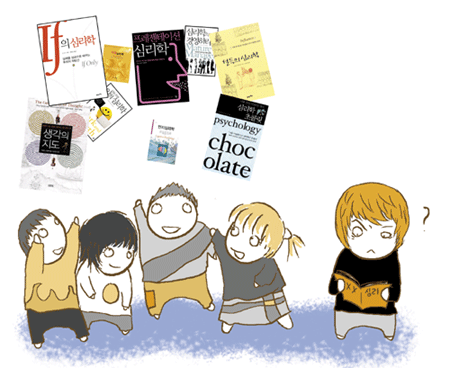
심리학 서적 출판의 현재 흐름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대학 교재로 사용될 만한 심리학 일반 관련 책들이 서점을 채웠다면 지금은 심리학 대중서가 인기다. 심리학 대중서는 『지능 심리학』, 『인지 심리학』과 같이 분과심리학을 알기 쉽게 설명한 서적과 『설득의 심리학』, 『성공심리학』처럼 심리학의 이론을 차용한 처세 실용서로 구분된다.
대중들이 심리학 대중서를 꾸준히 찾는 이유는 다양하다. 한국출판연구소 박호상 연구원은 “경제 상황과 같은 거시적 현상은 개인이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독자들은 내면화할 수 있는 문제들, 즉 해결 가능한 심리적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심리학 서적들을 찾는다”고 말했다. 또 권석만 교수(심리학과)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 내면적 사고, 감정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우리나라 국민들도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생존과 관련된 문제보다는 개인의 행복, 성장, 자기 계발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그 원인을 현재 한국문화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 출판평론가 표정훈씨는 “이런 현상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문화와 관련이 있다”며 “그런 문화일수록 타인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하는 욕구와 자신의 심리를 분석하고 싶은 욕구가 더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심리학이 하나의 키워드로 통용되는 만큼 출판계는 ‘심리학’을 이용하려고 한다. 박 연구원은 “독자들이 친근감을 느끼는 심리학을 책의 제목, 부제, 광고 등에서 적극 활용하려는 흐름이 있다”고 말했다. 가령 『심리학 초콜릿』의 경우 저자의 전공과 책의 내용 모두 심리학과는 다른 신경정신과학이지만 표제에는 심리학이라는 용어가 포함돼 있다. 실제 서점에 가서 경제학 등 심리학과는 다른 분야를 다루면서도 제목에 ‘심리’나 ‘심리학’을 포함시킨 책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다.
출판계가 심리학이라는 용어를 남용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최인철 교수(심리학과)는 “심리학 대중서 중 심리학 개론 수준의 내용 혹은 그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적절한 지식에 근거한 저서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심리학 관련 도서들이 인기를 끌면서 모방 출간이 잇따르게 됐고, 이에 전문성 없는 저자마저 심리학이라는 이름만을 차용해 책을 출간하는 일 역시 잦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 심리학 서적을 읽고 싶어 하는 대중들이 양질의 심리학 도서를 고르는 방법은 무엇일까. 심리학 도서는 사회과학서인 만큼 저자의 전문지식이 담보돼야한다. 이 때문에 심리학 대중서를 고르기 전에 저자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 필요하다. 번거롭더라도 책에서 인용한 참고목록을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최인철 교수는 ‘참고문헌이 잘 갖춰지고 전문성을 가진 저자가 쓴 심리학 대중서’로 『설득의 심리학』, 『생각의 지도』, 『If의 심리학』 등을 추천했다.
양질의 심리학 대중서를 고르는 것도 문제지만 책을 받아들이는 독자의 태도 역시 중요하다. ‘심리’라는 단어가 표제나 부제에 포함돼있더라도 그 책이 심리학의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준다고 맹신해서는 안된다. 대중서는 좀 더 심화된 내용의 책에 관심을 두게끔 도와주는 징검다리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심리학 분야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
유병준 기자
skyhigh@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