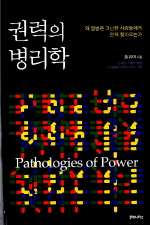
세계인권선언문 제25조에는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다르푸르 분쟁으로 아직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수단의 난민에게 세계인권선언문은 단지 보기 좋은 ‘허울’에 불과하다.
지난 9일(월) 출간된 『권력의 병리학』은 세계인권선언문에 명시된 권리를 누리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한 현실을 고발한다. 폴 파머 교수(미국 하버드대 사회의학과)는 “선진국의 정책결정자는 자신의 ‘동료’인 인류가 고통받도록 방조하고 있고, 그 결과 비선진국의 사람에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같은 주장은 미국의 횡포를 고발하는 촘스키의 지적과도 닮아있다. 하지만 그는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참혹한 사실에서 시작해 그 속에 숨어있는 ‘구조적인 폭력’을 역순으로 추적해 나간다. 저자는 지난 20년 동안 아이티 등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숨겨진 진실을 병리학적으로 파헤친다.
저자는 “질병과 가난, 인권의 침해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으며, 그 분포와 영향력 역시 무작위로 나타나지 않는다. 즉 권력에 의한 병리증상으로 사회적 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아이티, 페루, 러시아, 르완다 등 가난한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 기준을 높이기 위해 애써왔다. 그는 불평등한 사회가 질병의 확산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을 체감했다. 현대 의료기술의 진보 덕분에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병도 시장의 효율성과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죽음을 선사한다는 것이다. 중미 카리브해의 아이티에서 교통사고로 분쇄골절을 당한 청년 마노는 부러진 뼈를 제대로 고정하는 등의 치료를 받지 못해 다리를 잃어야 했다.
파머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행해지는 ‘구조적인 폭력’이 범죄라고 주장한다. 치료할 수 있는데도 이윤이 남지 않기에 방치하는 것도 일종의 ‘가해’이기 때문이다. 또 파머는 의료, 주택, 식수, 교육 등 사회, 경제적 권리를 인권운동 진영에서조차 홀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의 의료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침묵은 암묵적 동의’라며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권력의 공범자가 되지 않기 위해 저자가 제시한 대안은 무엇인가. 파머는 중립성, 비용 효율성에 기반을 둔 주류 의료 관행들과 정책 결정자들에 맞서 ‘가난한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접근법’이 절박함을 주장한다. 그가 내세운 대안이 상식선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최소한의 상식을 따르지 않은 인류는 이미 일을 벌여놓은 뒤 후회하곤 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그의 충고를 다시 생각해야 할 이유다.
서종갑 기자
shymissoni@snu.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