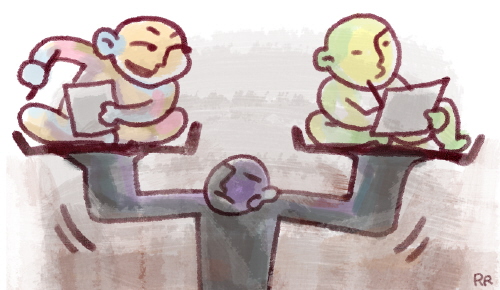
표절의 기준은 각 분야에 따라 다양하다. 특히 문학의 경우 개별 사례마다 사안이 다르기에 어떤 작품을 손쉽게 표절작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특정 구절의 인용 여부와 같은 단순한 사례와 달리 소재 해석이나 작품 구성의 측면으로 나아가면 상황은 한층 복잡해진다. 문학평론가 이명원씨는 “특정 소재나 유사한 모티브를 활용해도 그것을 표절이라 단정 지을 순 없다”고 말했다. 물론 기존 작품을 창의적으로 참조한 경우 리처드 앨런 포스너 교수(미국 시카고대 법학부)가 『표절의 문화와 글쓰기의 윤리』에서 언급한 ‘창조적 모방’이 될 수도 있다. 책에 따르면 셰익스피어도 표절 논란에 휩싸였지만 그는 기존 작품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한 ‘창조적 모방’의 범주에 속하기에 표절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창조적 모방조차도 오늘날의 저작권 개념을 적용한다면 표절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표절 여부를 가늠할 기준이 그만큼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소모적인 표절 논란을 막기 위해서 표절과 관련된 기준이 시급히 정립돼야 한다. 박철화 교수(중앙대 문예창작과)는 “문학 등 예술 분야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장르의 콘텐츠를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작품의 영향을 받는 것과 표절의 경계가 무엇인지 명확히 구분해주는 지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기준의 확립으로 표절 자체를 근절할 수는 없어도 소모적인 표절 논란을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학계에는 이같은 기준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다. 문학계가 직접 표절 기준에 대한 내부 논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계의 경우 학술진흥재단에서 연구윤리와 관련된 규정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명원씨는 “문단이 창작윤리헌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절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명철 교수(광운대 교양학부)는 “표절 기준이 정립되는 한편 문예창작 관련 교육기관 등의 학생들에게 창작윤리를 교육과정의 일부분으로 가르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체계적인 창작윤리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작가가 된 이후에도 표절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학계 내부에서 표절에 관한 개별적인 의견 표명은 적지 않았지만 머리를 맞대는 논의의 장은 좀처럼 마련되지 못했다. 고명철 교수는 “표절의 기준에 대해 각자의 생각이 있을 것”이라며 “문학계 인사들이 모여 허심탄회하게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종갑 기자
shymissoni@snu.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