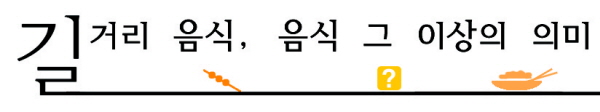
창녕읍 교하리에서 20년째 풀빵을 파는 김상순씨의 노점은 매우 인상적이다. 김씨가 풀빵을 구우면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서너 개씩 집어먹고는 그냥 지나간다. 돈을 내지 않는데도 김씨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다. 몸이 불편하거나 없는 사람들이 와서 부담 없이 먹고 가게 해주기 위해서란다. 1천원어치 풀빵이지만 수십, 수백 배의 선행과 인정이 오가는 셈이다. 김광억 교수(인류학과)는 “길거리 음식은 금전적, 공간적 여유가 없는 노점상과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한데 어우러지게 하는 매개체”며 “갈수록 생활패턴이 바빠지는 현대인들에게 잠깐의 여유와 푸근한 정을 느끼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길거리 음식의 세계화 가능성을 논하기도 한다. 실제로 국내업체가 만든 ‘델리만쥬’나 감자를 둥글게 깎아 꼬치에 끼워 파는 ‘회오리 감자’는 세계음식박람회에서 호평 받으며 그리스, 말레이시아, 중국, 싱가포르 등으로 수출되는 한국의 길거리 음식이다. 한식 세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문을 연 떡볶이연구소 이상호 소장은 “가장 대중적인 음식이 가장 세계적”이라며 “길거리 음식 역시 한국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인정도, 정겨움도 더 이상 거리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질지도 모른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디자인산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노점상들이 거리에서 쫓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강정원 교수(인류학과)는 길거리 음식이 갖는 한국 전통의 일면을 통해 길거리 음식의 가치를 강조했다. 강 교수는 “길거리 음식을 보면 사회적 계급에 상관없이 다함께 서서 음식을 먹는데 이는 조선시대 후기 주막 또는 선술집의 전통이 전해 내려오는 것”이라며 “외관상 이유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이러한 전통을 제재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봐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양기동 기자
kidyang@snu.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