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실험극단 드림플레이 김재엽 연출가 인터뷰
“관객들이 진짜 서점에 있는듯한 실험적인 연출을 시도해 봤습니다”
“전문 연극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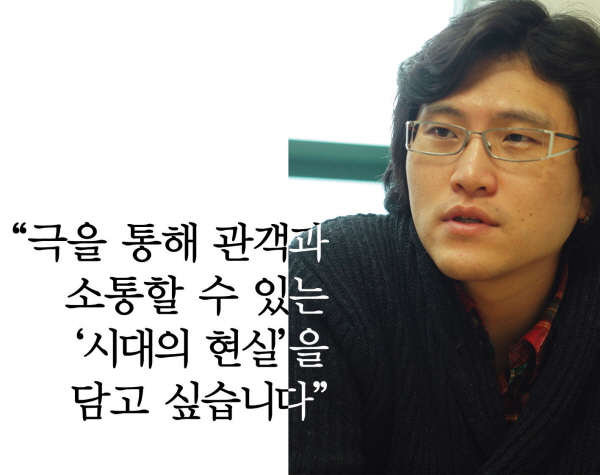
극작가이자 연출자인 김재엽씨의 「누가 대한민국 20대를 구원할 것인가?」의 한 장면이다.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거침없이 쏘아대는 그의 비판 어린 시선에 ‘88만원 세대’는 가슴을 졸인다. 대중극을 선호하는 동료 극작가들 사이에서 ‘별종’으로 불리는 그는 흥미 위주의 상업적 연극이 아닌 실험극을 지향하는 실험예술극단 ‘드림플레이(Dream Play)’를 조직하고 끊임없이 사회성 짙은 작품을 시도하기로 유명하다.
김재엽씨는 연극을 통해 ‘소통’을 추구하는 극작가다. 오늘날 20대의 관심이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를 고발한 「누가 대한민국 20대를 구원할 것인가?」를 비롯해 이제는 기성세대가 된 90년대 학생운동권들이 현실에 안주한 자신들을 한탄하는 「오늘의 책은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무작정 상경한 시골 사람들이 산업화, 도시화의 바람 속에서 내몰리는 과정을 보여 준 「장석조네 사람들(2009, 김소진 원작)」 등, 그는 각 세대의 고민을 그 시대의 입장에서 신랄하게 담아낸다.
“정치적인 문제는 시간이 흘러도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되지만 그 안에서 각 세대가 안고 있는 고민은 다르죠. 가령 제가 대학생이었던 1997년, 모든 술집은 12시가 되면 문을 닫아야 했고 노래방에 가 선배들한테 혼났다고 말하면 요즘 학생들은 아무도 안 믿어요. 이들이 소통하려면 서로 살아온 시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합니다”
사실 그가 처음부터 사회적인 작품을 추구했던 것은 아니었다. 200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등단작 「페르소나」 를 비롯해 그는 본래 사회와는 동떨어진 꿈, 환상 등을 즐겨 다뤘다. 그러던 그가 극단 ‘드림플레이’를 조직하면서 뮤지컬, 코미디 등 흥미 위주의 상업적인 극이 넘쳐나는 대학로에서 기존에 없던 실험극을 시도하며 시대의 ‘현실’을 담아내기 시작한다. 그는 “관객이 연극을 보면서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현실에 대한 우리네들의 삶이란 생각에 차츰 이에 대한 제 생각을 극에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오늘의 책은 어디로 갔을까?」에서는 20대 때 열렬한 운동권이었다가 지금은 기성세대가 돼버린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한 심정을 드러냈죠. 특히 이 극에선 진짜 서점 같은 세트를 만들어 극이 끝났을 때 관객들이 직접 무대에서 책을 구경하고 사갈 수 있는 실험적인 연출을 시도해봤어요”라고 말한다.
그는 유달리 우리나라 연극계에 대해 고민이 많다. 그는 “계속해서 평가할 증거가 남는 영화와 달리 연극은 일회적이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평가가 활발하지 않아 재정 지원을 받는 기준이 불분명합니다”라고 지적한다. 이어 그는 젊은 작가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작품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연극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극장이에요. 대학로에서 중간 규모의 소극장을 빌리는데 하루 60만~70만원이 들어요. 지원금 대부분이 대관료로 쓰이죠. 빚을 지면서 공연하는 팀이 많다 보니 자연히 연극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요. 재원을 통합해 공공 극장을 만들고 연극인들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그는 다음달 3일부터 무대에 오를 예정인 극작가의 창작의 고통을 표현한 「체크메이트」 공연 준비에 여념이 없다. 그럼에도 틈틈이 새로운 극을 구상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15가지 생의 순간들을 작품으로 담아보는 것을 구상 중입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당찬 포부가 느껴진다. 과연 그가 포착한 생의 순간은 어떤 모습일까.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그의 창작 열정에 기대를 걸어본다.
